모스크바의 겨울은 길다. 첫눈이 내리는 날부터 따져 봄 기운을 느낄 때까지 대략 짧게는 5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다. 이후 자주 비가 내리는 짧은 봄을 거쳐 바로 화창하고 따가운 여름날씨로 넘어간다.
모스크바 겨울 날씨는 한마디로 음침하다. 낮이 턱없이 짧은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햇볕을 볼 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눈이 내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뭔가 곧 내릴 듯이 우중충한 날씨다. 구름 낀 하늘은 손에 닿을 듯이 저만큼 내려와 있다. 몸이 늘 찌뿌둥하고 생체 리듬이 답답하게 느끼는 이유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겨울철에는 대기의 기압이 뚝 떨어진다. 현저히 낮은 (저)기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에서 실제 몸으로 느끼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다르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잠이 모자란 것처럼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아프다. 몸을 심하게 좀 움직이면 그나마 나아진다. 현지 사람들은 이를 모스크바의 저기압 때문이라고 여기고, 그게 사실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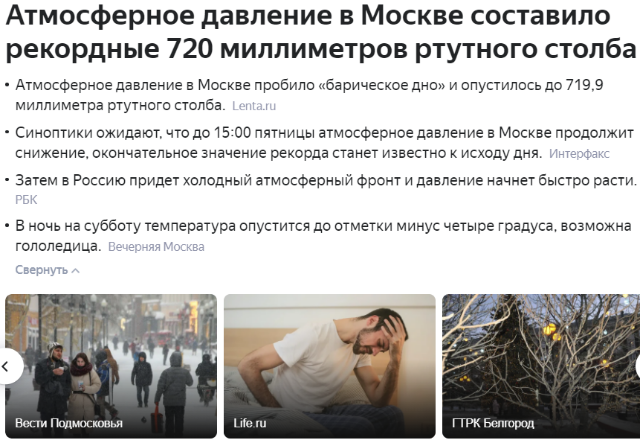
모스크바의 기압이 사상 최저인 720mmHg를 기록/얀덱스 캡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새해들어 모스크바 날씨는 저기압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14일 모스크바에서 관측된 기압은 719.7mmHg(베덴하 기상 관측소)로, 1948년 이후 가장 낮은 기압를 기록했다. 모스크바의 정상 기압(740mmHg)과 비교하면 무려 20mmHg나 낮다. 이전 최저 기압은 1948년 720.6 mmHg였다. 대신 그날 모스크바의 기온은 거의 영상 가까이로 올랐다.
기상 전문가들은 대기의 기압이 급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심한 두통과 피로, 무력감 등을 느낀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혈압 환자는 심장마비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극의 혹한 날씨가 밖으로 나다니기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고기압을 형성한 탓에 몸에도 더 나을 지도 모른다.
미 보스톤 아동병원의 비게노 프린스 박사(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기압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심해지고 심장마비 환자가 늘어난다. 덩달아 자살률도 높아진다. 저기압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공격적이 되며 육체적 능력도 떨어진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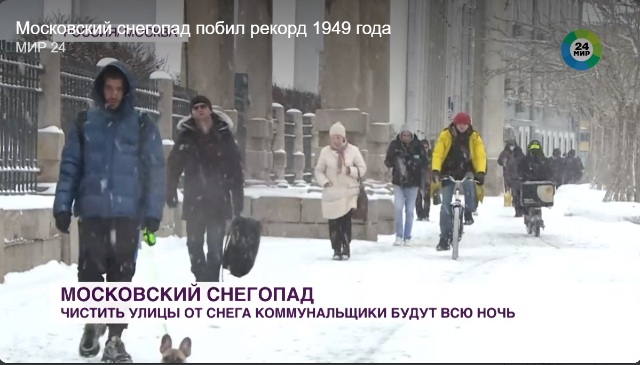
모스크바의 겨울 풍경. 자막엔 눈폭탄 예고가 떠 있다/현지 TV 동영상 캡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풍경/사진출처:@김광현 페북
겨울철 거의 내내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모스크바에서는 몸으로 체득한 다양한 '비법'들이 날씨를 이겨내는 동력이 되곤 했다. 1990년대 모스크바 한인 1세대에게 '겨울을 몇번이나 지냈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이유였다. 모스크바에 갓 도착한 사람에게 '모스크바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줄만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가 갈렸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모스크바의 첫번째 겨울이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겨울 초입에 도착한 사람들은 기다려도 기다려도 끝나지 않는 질긴 눈발과 혹독한 추위에 시작부터 정나미가 떨어지고, 화장한 여름철을 지낸 뒤 첫 겨울을 맞은 사람에게는 '나폴레옹 군대가, 히틀러 군대가 왜 모스크바에서 패할 수 밖에 없었는지' 체감하게 된다.
이 때 주변의 '모스크바 선배'가 권하는 비법이 러시아식 사우나인 '바냐'다. 몸을 한껏 달군 뒤 찬물에 뛰어들거나, 쌓인 눈위를 뒹구는 기분은 최고다. 그리고 마시는 보드카 한잔. 현지인들이 겨울을 건강하게 나는 방법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시베리아횡단열차의 겨울철 정차 모습/바이러 자료사진
점심 때 반주로 보드카를 마시곤 했다. 날씨가 추우니, 보드카를 마시고 몸을 덥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독한 알콜로 혈압을 올리는 것이다.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모스크바의 겨울 날씨, 즉 정상보다 20mmHg 가까이 낮은 저기압에서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려면 알콜로 혈압을 높이는 게 최고였다.
신문사 모스크바 특파원의 하루 일과는 대개 서울시간에 맞춰 새벽에 일어나 기사를 보내고, 뜨거운 물에 샤워한 뒤 늦은 아침을 먹거나 간단히 먹고 사무실로 나가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그날 신문들을 대충 훑어본 뒤 점심 약속을 잡기 시작한다. 겨울에는 특히 그랬다. 함께 보드카를 마실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술자리에게 흔히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모스크바의 긴 겨울철, 혼자서 보드카를 마시기 시작하면 '알콜 중독'에 빠진다'는 경고다.
동료 특파원들과 자주 어울렸다. 이 지긋지긋한 겨울을 이겨내려면 보드카 밖에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결과적으로 저기압이 심한 모스크바 날씨에서 몸의 컨디션을 지켜주는 '약주'였던 셈이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슈퍼마켓에 진열된 각종 보드카/바이러 자료 사진
그러다 보니, 보드카의 흑역사도 없지 않다. 보드카도 자주 마시면 '소주'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두셋이서 보드카 한병(700㎖인지 1000㎖인지 정확하지 않다)을 나눠마시는 건 보통이다. 문제는 섞어 마실 때다. 둘이서 보드카 한병을 나눠 마신 뒤 자리를 옮겨 양주 폭탄을 한두잔 들이킨 뒤 완전히 기억을 잃은 사건(?)은 아직도 흑역사로 남아 있다.(바이러시아자료)
'에따 러시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가능성은? 2022년 중 확률 낮다? (0) | 2022.01.28 |
|---|---|
| 러시아 피겨 여자 싱글, 베이징 동계올림픽서 금, 은, 동메달 싹쓸이 노려 (0) | 2022.01.25 |
| 미러, 사이버 보안 공조로 악명높은 랜섬웨어 범죄 조직 척결 - 관계 개선 청신호? (0) | 2022.01.17 |
| 과격 소요사태 진정, 권력내 친시위 세력 척결, 평화유지군 증강. (0) | 2022.01.10 |
| 러시아에서는 새해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 (0) | 2022.01.05 |
